2014년 이후 놈코어(노멀과 하드코어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 코드)와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면서 로고는 잠시 전면에서 자취를 감췄다. 아무 무늬가 없는 가죽 재질에 잠금 디자인도 최소화한 셀린느, 쿠론 백이 대표적인 ‘로고 리스(logo-less)’ 가방으로 유행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세련된 것이라 믿었다.
2017년, 돌아온 로고는 가방과 구두의 심장부를 점령한다. 로고 사이즈는 커지고 가죽에도 낯익은 패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프라다 관계자는 “특유의 역삼각형 로고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고 플레잉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더 크게, 더 당당하게
2017년, 돌아온 로고는 가방과 구두의 심장부를 점령한다. 로고 사이즈는 커지고 가죽에도 낯익은 패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프라다 관계자는 “특유의 역삼각형 로고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고 플레잉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더 크게, 더 당당하게

진부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명품업계는 두 가지로 답한다. 더 크게, 더 당당하게. 목적이 분명한 바에야 망설이는 게 더 진부하다. 주인공인 로고와 패턴에 아낌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나머진 배경으로 치부한다.
루이뷔통은 프랑스 파리의 산책을 모티프로 한 올해 봄·여름 컬렉션 ‘시리즈6’를 공개했다. 모노그램과 ‘LV’ 로고가 눈에 띄는 신상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파리 도심 주택의 오래된 청동 문고리에 걸린 검정 숄더백에는 루이뷔통의 심벌, ‘LV’ 로고가 양각으로 중심에 새겨져 있다. 모델이 가방을 끌어안고 문에 비스듬히 기대자 로고는 햇빛을 받아 더욱 도드라진다. 토트백과 지갑에서도, 특유의 모노그램과 꽃문양이 어우러진 루이뷔통 패턴이 다시 전면을 가득 채웠다.
프라다는 신형 클러치백인 사피아노 메탈 오로 No. 1ZH025의 2017년 버전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가방 제품에서 로고의 크기를 확대했다. ‘PRADA’ 문구 로고뿐만 아니라 특유의 역삼각형 로고도 커졌다. 1990년대 후반 유행했던 프라다의 대표 패턴을 신발 전면에 적용한 미크로슈즈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구찌 알레산드로 미켈레 컬렉션 대표작인 마몽 핸드백. ‘GG’ 로고를 강조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최소화했다. 구찌 제공
구찌 알레산드로 미켈레 컬렉션 대표작인 마몽 핸드백. ‘GG’ 로고를 강조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최소화했다. 구찌 제공구찌의 ‘GG’ 로고도 부활했다. 단순하고 매끈한 가죽 겉면 위에 커다란 금박 GG 로고가 붙은 ‘마몽’ 가방과 구두가 나란히 웨이팅 리스트에 올랐다. 이 디자인을 변주해 검정 가죽에 빨간 하트가 함께 들어간 ‘마몽 하트’ 라인 제품은 단기 매진됐다. 내부에서 파격 승진한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 리브랜딩’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펜디는 채도 높은 원색으로 칠한 로고를 과감히 내세웠다.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개된 2017년 가을·겨울 시즌 남성복 컬렉션에서 펜디 로고는 현란하게 살아났다. 스포츠백 전면에 삐뚤빼뚤 쓴 컬러풀한 ‘FENDI’ 로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천 재질 가방 하단에도 로고가 수놓였다. 일부 모델은 머리 뒤에도 흘림체로 쓴 ‘Fendi’를 새겨 주목을 끌었다.
익숙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가방, 신발뿐일까. 티셔츠와 캐주얼 모자로 앵글을 돌리면 로고 플레이는 더욱 파격적이 된다.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 벽엔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고 후드 셔츠 한가운데에 볼드체로 브랜드 로고가 박힌 그 반항적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다. 다만, 미니멀리즘 시대를 건너오면서 군더더기는 줄고 더 단순해졌다.
로고 티셔츠의 부활은 ‘겐조’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낡은 이미지로 고군분투하던 겐조는 2012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뉴욕 편집매장 ‘오프닝 세리머니’의 창업자 캐럴 림과 움베르토 레온을 영입했다. 파격적 시도였다. 이들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마케터이자 바이어였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이들은 커다란 호랑이 그림과 ‘KENZO’ 로고가 위풍당당하게 적힌 맨투맨 티셔츠를 내놨다. 그때부터 겐조는 가장 ‘핫’한 브랜드로 떠올랐다. 캐주얼, 스트리트 무드와도 잘 어우러졌다.
요즘 스트리트 무드의 1인자는 누가 뭐래도 프랑스 ‘베트망’의 디자이너 템나 그바살리아다. 로고를 자유자재로 디자인에 녹여 세계 패션을 열광케 하고 있다. 익숙한 이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은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다. 명품 브랜드가 캐주얼 패션에 접목한 로고 플레이 제품들은 그래서 오히려 실험적이다.
베트망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양말, 후드티셔츠는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렸다. 양말은 유럽 현지에서 7만∼8만 원 수준이다. 양말처럼 생긴 로고 부츠는 2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역시 인기 있다. 우리가 아는 이스트백 가방에 로고가 붙으면 70만∼80만 원으로 가격이 뛴다. 그가 손을 대면 같은 로고 패션이라도 ‘쿨’하고 ‘동시대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다 못해 지난해 내놓은 메탈 담뱃갑은 미국 가격으로 약 770달러였지만 바로 품절되자 비판이 일기도 했다.
미국 패션일간지 WWD는 “그바살리아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붙여도 살 건지 물어보는 듯하다. 베트망 로고가 없는 담뱃갑은 대개 25달러 이하”라고 쓰기도 했다.
그바살리아가 지난해 유서 깊은 프랑스 패션하우스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스카우트되면서 발렌시아가도 덩달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나온 발렌시아가 로고가 선명히 박힌 볼캡은 유럽 현지가격 약 30만 원대. 로고가 없다면 1만 원 안짝에 살 수 있으리라. 진짜도 없어서 못 판다. 벌써 한국 동대문에 가짜가 쫙 깔렸다.
왜 다시 로고인가
 펜디 2017 가을·겨울 시즌 남성복 컬렉션.
펜디 2017 가을·겨울 시즌 남성복 컬렉션.문화적 측면에서 최근의 로고 플레이는 스트리트 패션이 뉴욕 런웨이의 하이패션으로 융합돼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고급스러움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하이패션은 아예 로고 자체를 숨기는 로고 리스로 정점을 찍었다. 이제 엘레강스는 충분하다. 그 정확한 반동으로 튀어나온 게 스트리트 패션이다.
스트리트 패션은 그라피티처럼 강렬하고 거침이 없다. 기존에 뒷골목, 어두움, 자유, 반동 등을 상징하던 스트리트 패션은 이제 사회적 소외층이 아닌 주류층, 패션 피플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 사회 지도층이 그들만의 리그, 폐쇄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특유의 문화를 향유했다면, 이제 리더들도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대는 ‘쇼잉(showing)’ 욕구가 DNA에 새겨진 세대다. 좀 더 튀고, 좀 더 명확해야 하루 수십, 수백만 개의 새로운 페이지에서도 돋보일 수 있다. 고동휘 에스콰이어 에디터는 올해 2월호 ‘왜 다시 로고가 등장했나?’ 제하 칼럼에서 “인스타그램에 구찌 로고가 박힌 47만 원짜리 빈티지 티셔츠 사진 한 장 찍어 올리는 건 구구절절함 없이 간편하게 당신을 쇼잉해줄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도 한몫했다. 에르메스 등 고가 브랜드는 여전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셔츠와 신발 등에서 ‘명품 티’를 내는 신상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스트리트 패션인 듯 아닌 듯, 스포츠 패션인 듯 아닌 듯 젊고 경쾌한 명품들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세대에겐 매력적이다.
온통 컬러풀한 로고 밴드를 모델들이 이마에 쓰고 나왔던 펜디 런웨이를 보고 나서 보그 칼럼니스트 루크 레이치는 썼다. “펜디가 민중적인 브랜드가 될 순 없겠지만, 여기서 얼굴 전면에 내세운 슬로건들과 현대-고전의 섬세한 조합은 그 열망을 잘 드러냈다.” 브랜드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는 한, 로고 플레이는 돌아오고, 또 돌아올 것이다.
곽도영 now@donga.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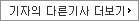 ·김현수 기자
·김현수 기자
온통 컬러풀한 로고 밴드를 모델들이 이마에 쓰고 나왔던 펜디 런웨이를 보고 나서 보그 칼럼니스트 루크 레이치는 썼다. “펜디가 민중적인 브랜드가 될 순 없겠지만, 여기서 얼굴 전면에 내세운 슬로건들과 현대-고전의 섬세한 조합은 그 열망을 잘 드러냈다.” 브랜드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는 한, 로고 플레이는 돌아오고, 또 돌아올 것이다.
곽도영 now@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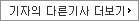 ·김현수 기자
·김현수 기자
